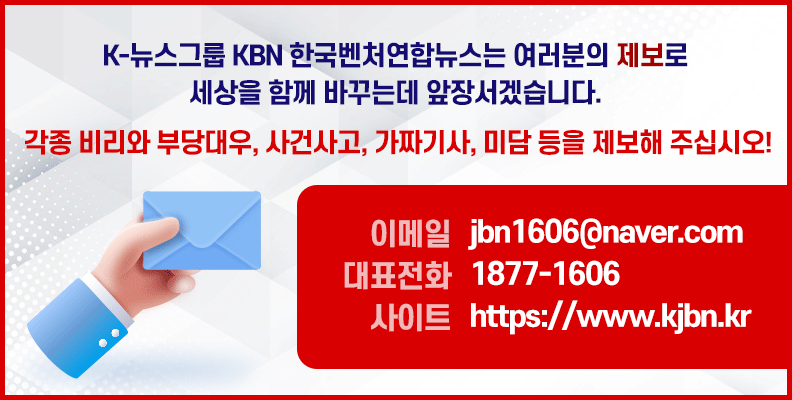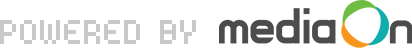아침 출근 준비는 언제나 분주했다. 그렇기에 출근하는 길에 어디를 들려서 간다는 것은 더더욱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늘 언제나.
내게는 우리 집과 가까이 살고 계시는 친정엄마가 계셨다. 시간 개념 없이 전화하시는 엄마 때문에 걸려오는 전화를 놓칠 때가 많았다. 어느 금요일 이른 아침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삼 일 전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걸려온 전화를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받게 되었다. 엄마의 말씀은 오전에 봉천동 현대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겠다는 말씀이셨다. 그날은 나의 일정상 늦게 출근할 수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모시고 시장에 내려드리겠다고 전해 드렸다.
시장에 내려드린 날 오후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다. 받지 않으셨다. 약간의 걱정스러움이 밀려왔다. 시장에 내려드릴 때 쉽게 그곳을 알아보지 못하시고 "여기가 어디냐? 오메"라며 엄청 숨차 하시고 장소를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셨기에 드린 전화였다. 내려드릴 당시 좌회전 차량들이 계속 오는 상황이라 엄마를 내려드리기 바빴고 교통 흐름 상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만 했다.
엄마는 세 번째로 전화를 드렸을 때 비로소 받으셨다. 휴~ 다행이었다. 나도 무언가 직감을 한 것이었을까? 그날따라 유독 엄마의 숨 차 하시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으니까. 시장 보고 택시 타고 잘 들어왔노라 하시면서 퇴근길에 들리라고 하셨다. 워낙 간곡히 들리라 말씀하시는 바람에 9시가 넘은 퇴근길이었으나 들리게 되었다.
엄마는 굴비를 신문지에 둘 둘 말아 싸서는 내게 주셨다. 집에 가 식구끼리 한 마리씩 구워서 먹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다음날 토요일을 맞이하였다. 이날도 출근 준비하느라 분주하였다.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울리는 전화를 패스하고 싶을 정도로 분주하였으나 받았다. 엄마는 말씀하셨다. "퇴근하는 길에 집에 와라. 어제 장 봐 온 거 생선이 있단 말다. 몇 마리 줄게야." 어제도 오라 해서 갔다가 생선 몇 마리 싸 주신 것 받아왔노라 말씀드렸다. 그래도 엄마는 막무가내 셨다. "네가 어제 왔었냐? 내가 어제 줬냐? 그랬냐? 아따 그래도 와야. 너 보고 잡은 게."
저녁 8시에 모든 업무가 끝났다. 서둘러 엄마 집으로 향하였다. 30분 후 도착한 나는 엄마의 숨차 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다. 숨차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셔."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나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서둘러 저녁 밥상을 차리셨다. 당신도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당신 밥까지 차려내셨다.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항상 오후 6시경이면 저녁 식사를 챙겨 드셨던 분인데···.
밤 9시면 주무시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되도록 드시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
작은 밥상 위에는 밥 두 그릇과 굴비 한 마리가 퐁당 빠진 것처럼 흥건하게 끓여진 탕이 있었다. 그리고 김치 두 가지. 고춧가루로 휘저은 듯 굴비 한 마리가 둥둥 떠 있는 탕은 왠지 느낌이 쏴 했다. TV에서는 YTN 뉴스 채널이라 오늘의 핫한 이슈들을 이야기하기 바빴다. 뉴스를 듣는 것도 아니면서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은 채 밥그릇만 서로가 비워냈다. 엄마는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말씀하셨다. "늦었다. 빨리 집에 가 쉬어라. 얘기들 기다릴라." 내쫓듯 쫓는 엄마에 의하여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일요일은 조용하게 지나갔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을 맞이하였고, 이날은 퇴근이 조금 일렀다. 오후 4시 30분에 집에 도착한 후 5시에 이른 저녁을 먹고 세면실에 들어가 간단하게 씻고 있었다.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대충 물기만 닦고 발신자를 확인하였다. 엄마였다. 또 오라고 하는 말씀이시겠지? 그냥 패스할까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 벨 소리는 평상시와 다르게 느껴졌다. 그래서 받았다. 다급한 엄마의 목소리. 평상시 전자기기를 타고 들려오던 목소리는 아니었다. 어딘가 다급해 보였고 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엄마, 엄마, 엄마"라며 애타게 부르짖는 막내딸의 울부짖는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듯 보였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 이 내게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대충 옷을 갈아입고 엄마에게 갔을 땐 심정지로 돌아가신 후였다. 나중에 시체 검안서에 기록된 사망 시간은 막내딸인 내가 도착하고 난 후, 2분이 지난 시간으로 기록되어있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 드렸다. 워낙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기 때문에 엄마의 죽음을 준비한 자식은 없었다. 그 이후 한동안 엄마가 돌아가시기 3일 전 금요일로 자꾸만 태엽을 되돌리게 되었다. 특히 토요일 밤 그 싸 한 느낌의 국물이 흥건했던 밥상에 대하여 늘 리플레이 하면서 영상을 떠올 리게 되었다. 엄마가 차려준 많은 밥상을 받아봤지만, 그날처럼 쏴 했던 밥상은 처음이었고 그런 흥건한 국물 역시 처음이었으니까. 그렇게 그 시간까지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다 힘들게 차려낸 밥상은 당신 살아생전 막내딸과의 마지막 겸상이 되었다.
엄마 당신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던 모양이다. 당신 홀로 가는 길을 준비하셨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다. 그해 어버이날이 평일이라 그 전 주 일요일 오후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고 집에 간다며 나섰을 때도 대문 밖까지 나오셨다. 우리 아이들이 당신의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셨다. 들어가시라, 이야기해도 한참을 대문에 손을 기댄 채 우리가 사라진 골목 모퉁이 끝을 바라보고 계셨다. 골목 모퉁이를 다 빠져나와 몰래 훔쳐보았을 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아이들 역시 할머니에게로 가서 한 번 더 안아드리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하여 두고두고 이야기하였다 · 그렇게 당신은 막내딸과의 마지막 밥상을 물리고 대문 밖까지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셨다. 당신만이 아는 마지막 인사. 나의 아이들을 지켜봤던 그 모습 그대로의 눈빛으로.

이렇게 나의 양육자 되어주셨던 분은 당신 막내딸과의 이 세상 인연의 대상 관계를 정리하셨다. 당신만의 방법으로 아주 조용하게 정리하셨다. 당신의 자궁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당신을 나의 양육자로 내 가슴에 각인시켰듯이···.
나의 양육자는 최고의 밥상을 차려내시고 가신단 한 마디 남기지 않고 그렇게 떠나가셨다.
“어머니, 제게 생명 주시고, 저의 부모님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