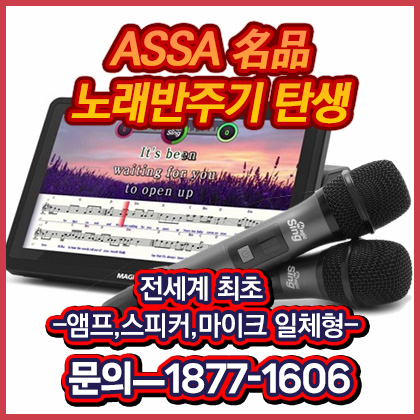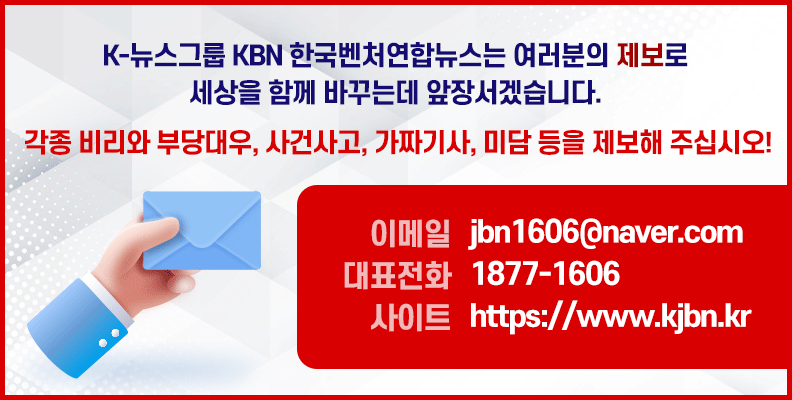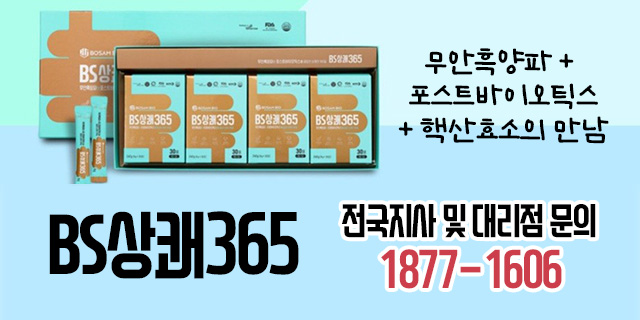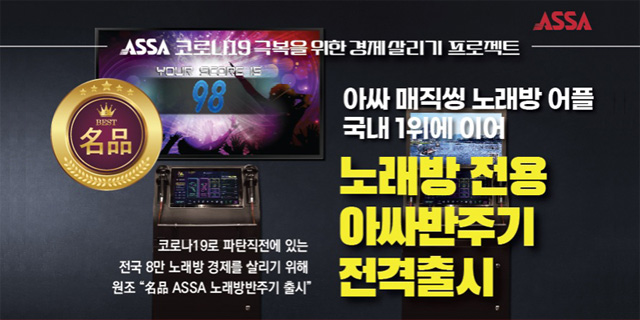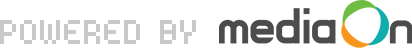버림받은 독립운동가. 아나키스트 박열
박열(朴烈)은 경상북도 문경에서 박영수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함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가 3.1운동에 가담하여 퇴학을 당했다.
박열은 일본 도쿄로 건너가서 세이소쿠가쿠엔 고등학교에서 수학했다. 사회주의자와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며 아나키즘단체인 흑도회(黑濤會)에서 활동했다. 또한 비밀결사조직인 의열단에 가입하고 비빌결사조직인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했다.
박열은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보호 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체포됐다. '일본인 부인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와 함께 히로히토 황태자의 혼례식을 기하여 다이쇼 천황과 히로히토 황태자 등을 폭탄으로 암살하기로 모의했다' 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1926년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가네코 후미코는 1926년 우쓰노미야 형무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박열은 일본이 패망하자 22년 2개월 만에 석방됐다.
박열은 1946년 김구의 부탁으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3의사 유해발굴 봉환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승만과 면담하고 '건국운동에서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재일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박열은 정부수립 이후 귀국했고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장을 맡다가 1974년 71세로 사망했다 1989년 박열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고 2018년 가네코 후미코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버림받은 독립운동가. 육삼정 의가 백정기
백정기(白貞基)는 전북 부안에서 장남으로 출생해서 7세에 정읍으로 이사하여 한학을 배웠다. 19세아 서울로 상경하여 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문과 전단을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백정기는 1919년 8월 일본인 및 일본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게획이 발각되자 중국으로 망명했다. 1924년 일본에 침투해 다이쇼 텐노 암살과 하야카와 수력발전소 공사장 파괴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백정기는 1924년 상하이에서 이회영 유자명 등과 함께 재중국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1932년 상하이에서 흑색공포단(BTP)을 조직하여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닌 아나키스트의 입장에서 독립투쟁을 전개했다.
백정기는 1933년 3월 상하이 훙커우(虹口)에 정현섭 원심창 이강훈 등의 아나키스트 들과 중국 주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일본공사가 일본 요정인 육삼정(六三亭)에서 연회를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백정기는 연회장 습격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육삼정(六三亭)에서 체포됐다. 백정기와 원심창은 무기징역을, 이강훈은 징역 15년 형을 언도됐다 백정기는 구마모토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1934년 38세의 나이로 옥사했다.
"내가 죽어도 사상은 죽지 않을 것이며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이오 ~ 조국의 자주 독립이 오거든 나의 유골을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해방된 조국 땅 어디라도 좋으니 묻어주고, 무궁화 꽃 한 송이를 무덤 위에 놓아주기 바라오." 라고 유언했다.
1946년 박열 이강훈 등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들이 '3의사 국민장 봉장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의사의 유골을 일본으로부터 회수하여 최초의 국민장을 실시하고 효창원 3의사 묘역에 안장했다.
백정기가 폐결핵으로 상하이 병원에 입원했다. 폐병으로 입원한 일본 갑부의 딸이 연정을 품자 "사랑하는 여자도 조국 앞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야." 라며 거절했다. 백정기는 1963년 박정희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