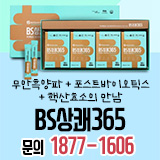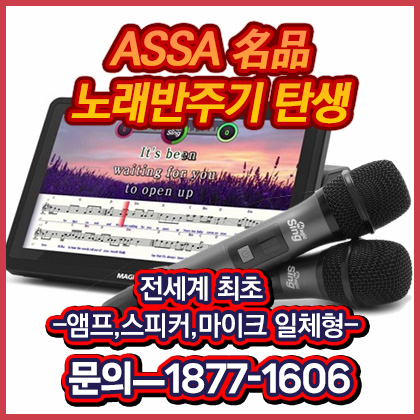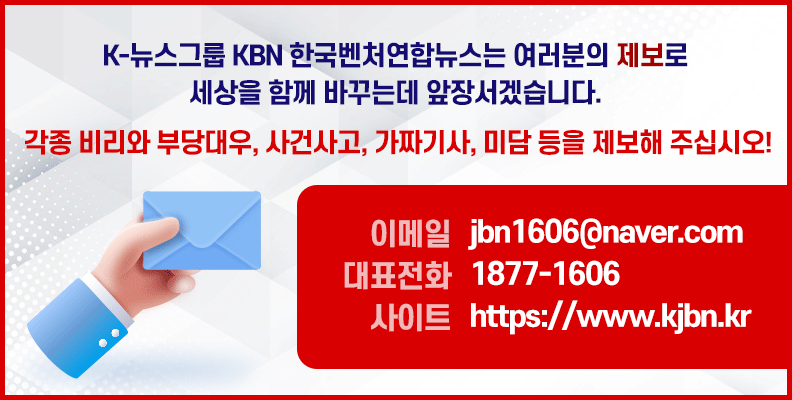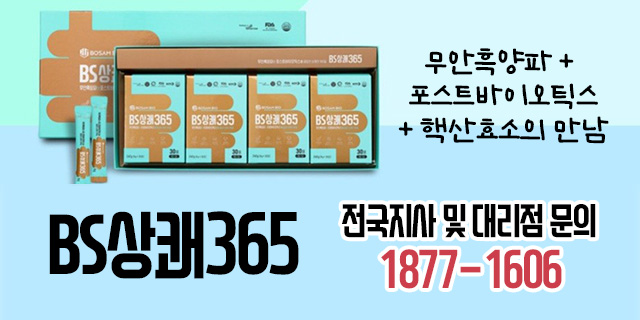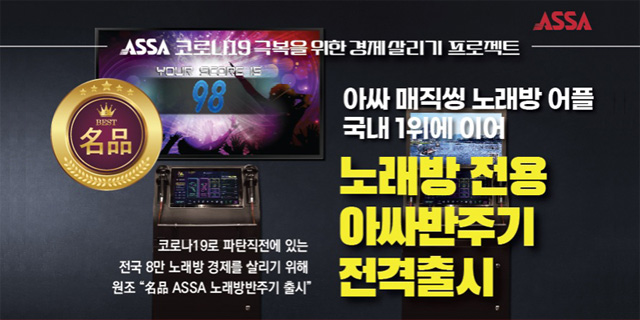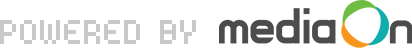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 |
사법부는 정의를, 언론은 진실을 밝힌다
― 공론장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두 주체 ―
◆ 정의와 진실, 서로를 비추는 거울
판사와 언론은 역할은 다르지만 공공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사법부는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 언론은 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혀낸다. 이 두 제도는 민주주의의 두 축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언론이 재판을 ‘재단’한다고 느끼고, 언론은 법원이 ‘닫힌 세계’라고 비판한다. 이 긴장 속에서도 사법과 언론은 서로를 견제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존재다. 언론이 사법권을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은 경직되고, 사법부가 여론에 휘둘리면 정의는 감정의 포로가 된다. 균형과 절제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재판은 법정에서, 그러나 신뢰는 공론장에서
판결은 법정에서 내려지지만, 그 판결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공론장’에서 형성된다. 국민은 법조문 원문보다 뉴스와 보도를 통해 사법을 경험한다. 따라서 언론은 ‘누가 이겼는가’보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법은 결과보다 이유가 중요하고, 언론은 그 이유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과 언론이 신뢰를 함께 구축하는 길이다.
◆ 과열된 여론은 정의의 적이다
사법 절차가 완결되기도 전에 언론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다루면 재판은 냉정함을 잃고, 정의는 여론의 파도 속에 흔들린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피의사실 공표와 편향적 보도는 법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재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힘이 큰 만큼, 자율적 윤리와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
◆ 사법부의 침묵도 신뢰를 잃는다
언론의 과열도 문제지만, 사법부의 침묵 역시 국민과의 거리를 만든다. 최근 대법원을 둘러싼 파기환송 논란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법이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판결이 곧 답이다”라고 말하지만, 현대사회는 그 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요구한다. 판결의 이유와 법리, 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은 적절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오해의 여지가 되기도 한다.
◆ 신뢰 회복의 길 ― 소통과 절제
사법부와 언론이 공존하는 길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경계를 존중하는 데 있다. 언론은 사법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사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양측이 각자의 자리에서 절제와 성찰을 가질 때 공론장은 균형을 되찾는다. 사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용기를, 언론은 충분히 검증된 정보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 그때 비로소 ‘정의의 신뢰’와 ‘진실의 신뢰’가 함께 선다.
◆ 맺음말
사법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이고, 언론은 그 정의를 사회에 전달하는 창이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통해 자신을 완성한다. 법이 진실을 세우고, 언론이 그 진실을 비추어줄 때 국민은 비로소 “정의가 살아 있다”고 느낀다. 신뢰는 법정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정 밖, 공론장의 언어와 태도 속에서 다시 자란다. 사법과 언론이 책임 있게 소통할 때, 민주주의는 더 강해지고 정의는 더 밝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