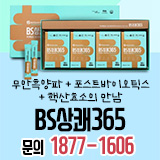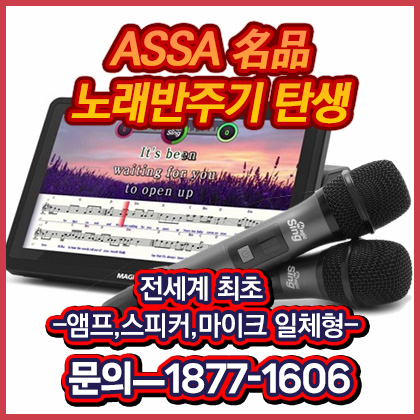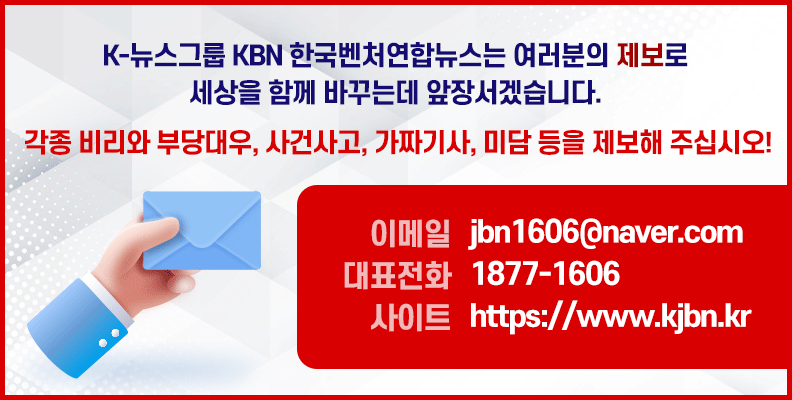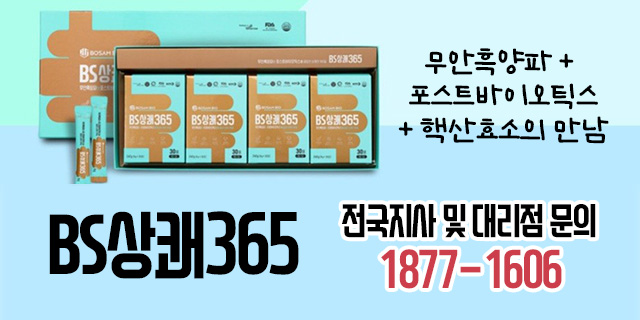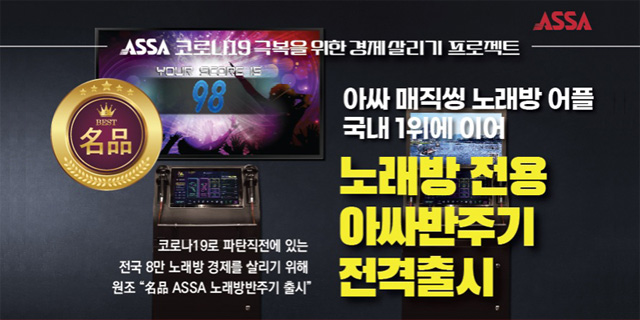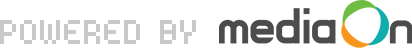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 l
낙향의 길, 조선 선비들의 기개(氣槪)
조선시대의 신하들에게 임금의 말은 곧 법이자 절대적 명령으로 통용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 명령이 도리에 어긋나거나 옳지 않다고 여겨질 때, 일부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직언하거나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을 택하였다. 이를 '사직(辭職)·사퇴(辭退) 또는 사관(謝官)’이라 불렀으며, 그 근본 정신은 ‘사의정신(捨義精神)' 즉 '옳음을 지키기 위해 벼슬과 이익을 버리는 정신' 으로 일컬어졌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도 왕명을 거슬러 낙향을 선택한 이들이 있었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거부이자 양심의 외침' 이었다. 여기서는 낙향을 하신 조선시대의 몇 분을 소개하면서 그 분들의 기개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 남명 조식 — 벼슬보다 도(道)를 중히 여긴 학자
남명 조식(曺植, 1501~1572)은 명종·선조대의 대학자로, 남명학파의 영수였다. 그는 여러 차례 조정의 벼슬 제안을 받았으나 끝내 거절하고 경남 합천에 머물며 학문과 제자 교육에 전념했다. 조정의 부당한 정치를 따르지 않고 '벼슬보다 도(道)' 를 택한 인물이었다. 그는 “벼슬은 무겁사오나 몸은 가볍사오니, 신의 자리에는 설 수 없사옵니다.”라며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표면상 병을 이유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혼탁한 정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 퇴계 이황 — 주리설(主理說)의 도학자, 도리 앞에 물러서다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주리설(主理說: 선한 정이 오직 성선性善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완성한 학자였다. 그는 여러 차례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신(臣)은 성품이 유약하고 병환이 깊어 아침 조회에도 나아갈 수 없사옵니다. 몸이 누추하여 국은을 갚을 길이 막혔사오니, 간절히 바라건대 고향으로 돌아가 생명을 도모하게 하소서.”라며 사직을 청했다. 겉으로는 병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본질은 '벼슬보다 도(道)를 지키겠다는 선택' 이었다. 그의 낙향은 세속 권력보다 학문과 도덕적 완성을 중히 여긴 '자의적 결단' 이었다.
◆ 점필재 김종직 — 불의한 권력에 대한 침묵의 저항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사림(士林派: 경술을 중시)의 영수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조의제문(弔義帝文): 생전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은유적으로 비판했던 글〉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신의 학문은 얕고 언행은 졸렬하여 직책을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조정의 큰 자리에 오래 머물러 폐단을 더할 수는 없사오니, 사직하여 고향으로 물러가고자 하나이다.”라며 상소를 올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는 단순한 사퇴가 아니라 '권력의 불의에 맞선 분명한 저항' 이었다. 비록 그는 사후 무오사화로 부관참시를 당했으나, 중종반정 이후 그의 학문과 정신은 재평가 되었다.
◆ 겸손 속의 결의, 조선 선비의 강단
그들의 상소문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같이 자신을 낮추며 '능력이 부족하다' 거나 '병이 깊다' 고 표현했지만, 그 속뜻은 '부당한 권력에 동조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겸손한 언어 속에 숨겨진 단호한 결의, 그것이 바로 조선 선비의 '기개' 였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낙향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양심을 지키려는 결단이자 정치적 저항의 행위' 였다. 권력에 줄 서는 것이 출세의 길이던 시대에도, 낙향을 택한 선비들은 오히려 이름을 길이 남겼다.
◆ 현대 사회에 필요한 ‘사의정신(捨義精神)’
오늘날 세계 각국의 권력 주변에는 ‘예스맨(Yes Man)’이 넘쳐난다. 그럴수록 조선 선비들의 기개가 더욱 그립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양심을 잃지 않는 사의정신,' 즉, 옳음을 위해 이익을 버릴 줄 아는 '도덕적 용기' 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도 그러한 '사의정신' 이 다시 깃들기를 바란다. 옳음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개,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찾아야 할 ‘선비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