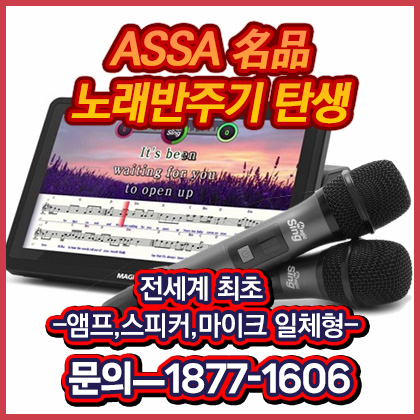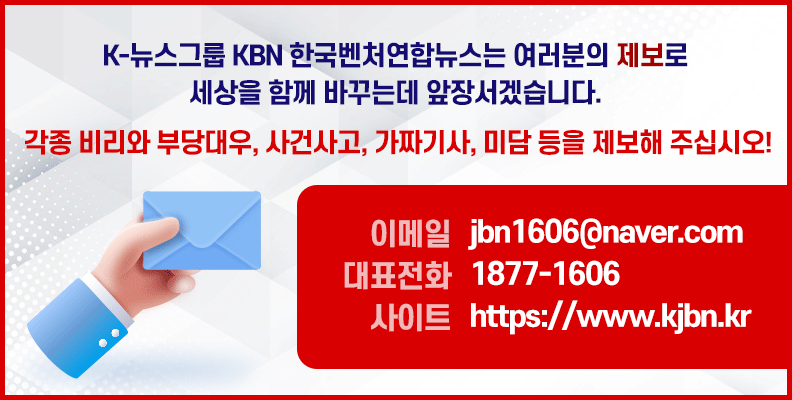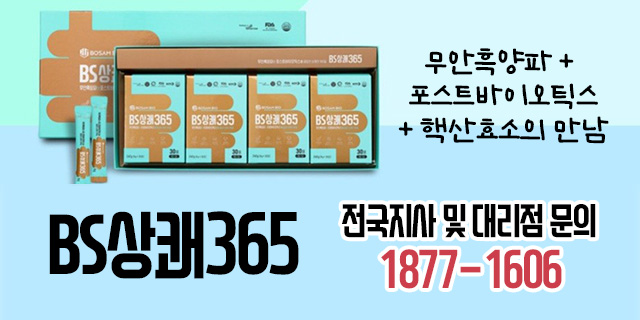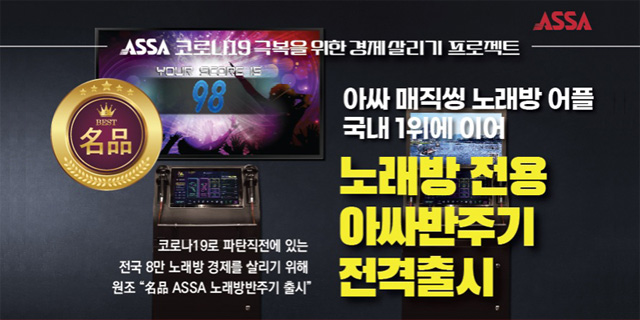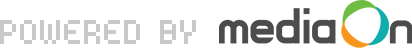면앙정 송순(宋純, 1493년 성종 24년∼1583년 선조 16년)은 담양에서 태어나서 호남 사림의 중조인 눌재 박상(朴祥, 1474~1530), 육봉 박우(朴祐, 1476~1546, 사암 박순의 아버지) 형제에게 학문을 배웠다.
종9품으로 출사하여 50년 만에 정2품까지 승진했다. 교우로는 성수침(成守琛, 1493~1564, 우계 성혼의 아버지), 이황(李滉, 1501~1570), 양산보(梁山甫, 1503~1557, 담양 소쇄원을 조성한 이) 등이 있었고 문인(門人)으로는 하서 김인후(金麟厚, 1510~1560), 고봉 기대승(奇大升, 1527~1572), 제봉 고경명(高敬命, 1533~1592), 송강 정철(1536~1593), 백호 임제(1549~1587) 등이 있었다.
중종의 장인인 외척 김안로가 권력을 잡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자연을 벗삼아 담양에서 4년간을 지냈다. 김안로가 탄핵을 받아 사사되자 송순은 경상도 관찰사로 복직했다. 중종의 처남인 외척 윤원형이 권력을 전횡하여 송순은 전라도 관찰사로 좌천되었으나 다시 복직했다.
송순은 77세에 정2품 의정부 우참찬으로 승진하자 벼슬을 사양하며 다시 담양으로 낙향했다. 성품이 온화하고 너그러워 주변에 사람이 많았으며 가야금에 능하고 풍류를 즐겨 호기로운 재상으로 알려졌다.

송순 ‘꽃이 진다하고 새들아 슬허마라’ 상춘가 남겨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송순은 '꽃이 진다 하고 새들아 슬허마라. 바람에 흩날리니 꽃의 탓 아니로다. 가노라 희짓는 봄을 새와 무삼 하리오.'라고 상춘가(傷春歌)를 남겼다.
송순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면앙정을 짓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교의 충의사상을 표현하는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선구자가 되었다. 면앙정에서 수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여 면앙정가단(俛仰亭歌壇)의 창설자가 되었다. 송순은 무등산 끝자락인 제월봉 아래에 면앙정이란 정자를 짓고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면앙은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뜻이다.
석천 임억령, 하서 김인후, 사암 박순, 고봉 기대승, 제봉 고경명, 송강 정철, 백호 임제 등을 비롯하여 멀리서는 양곡 소세양, 퇴계 이황, 오음 윤두수 등의 사대부들이 면앙정에 출입하며 시를 남겼다.
'무등산 한 활기 뫼히 동다히로 버더 이셔 ~ 이 몸이 이렁 굼도 역군이샷다'면앙정가는 무등산을 노래한 서사(序詞), 면앙정의 4계를 읊은 본사(本詞), 안빈낙도가 임금의 은혜라는 결사(結詞) 등 3단락 145구로 구성됐다. 송순의 ‘면앙정가’는 정극인의 ‘상춘곡’과 더불어 호남 가사문학의 원류가 되어 정철의 ‘사미인곡’과 ‘관동별곡’ 등 가사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면앙정을 짓고 ‘면앙정가단’ 창설
송순이 87세가 되자 면앙정에서 과거급제 60년을 축하하는 회방연(回榜宴)이 열렸다. 정철이 선조의 어사주를 가지고 담양까지 내려왔다. 잔치가 끝나자 정철을 비롯하여 고경명, 임제 등 제자들이 송순의 가마를 메고 집까지 모셨다.
정조는 1798년 광주에서 별시(別試)를 시행했는데, 송순을 가마에 태워 집으로 모신 것에 대한 응시자들의 생각을 쓰라는 ‘하여 면앙정(荷輿 俛仰亭)’을 시제로 냈다. 면앙정에는 ‘하여 면앙정(荷輿 俛仰亭)’이라는 정조의 어제가 걸려 있다.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러보면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를 짓고 흥취가 호연하다. 바람과 달을 불러들이고, 산천을 끌어들여 청려장 지팡이 짚고 백년을 보내네'
송순은 ‘면앙정 삼언가’를 비롯해 면앙정가, 오륜가 등 시조 22수와 한시 520여 수를 남겼다.
글. 서 일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