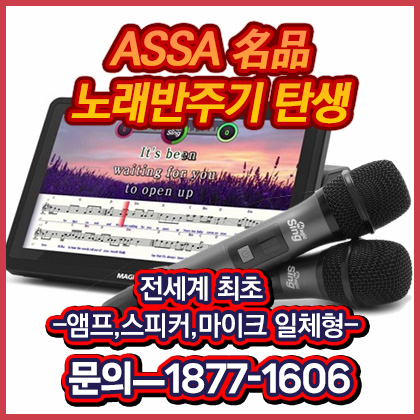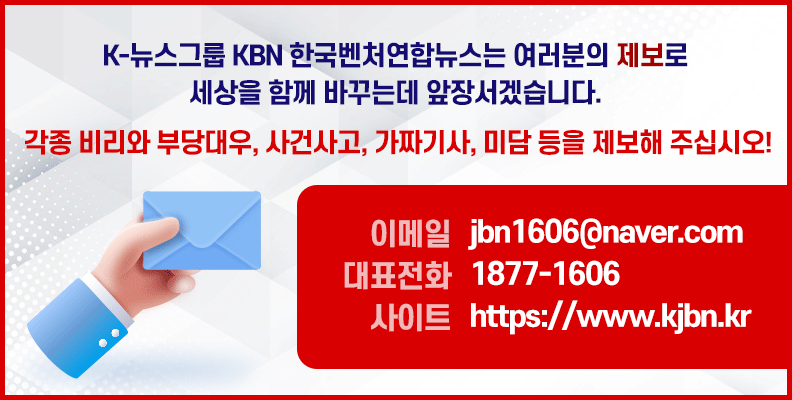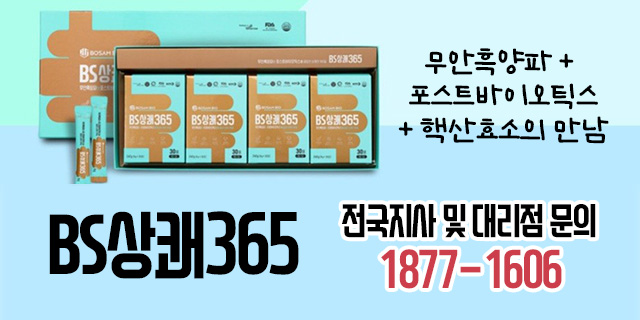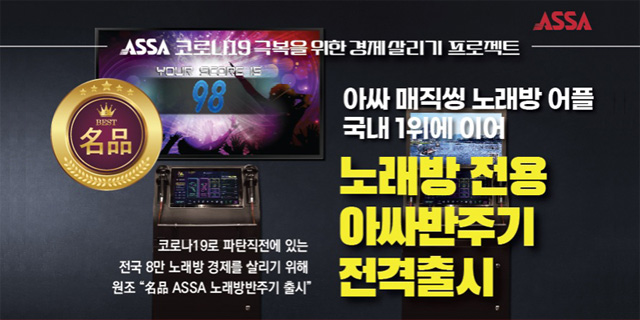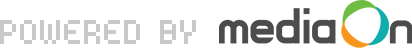문묘종사와 유교(儒敎)

문묘(文廟) 종사(從事)
신라 31대 신문왕은 나당전쟁으로 피폐해진 혼란을 정비하고 고등교육 기관인 국학(國學)을 설치했다. 김수충(金守忠)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공자(孔子) 공문10철 72제자의 화상(畫像)을 국학에 안치했다.
김수충은 신라의 33대 성덕왕의 아들로 견당유학생(遣唐留學生) 자격으로 당나라에 파견되어 3년 동안 머물면서 국학(國學)에 입학하여 유학을 수학했다. 당현종이 김수충을 총애하여 조당(朝堂)에서 연회까지 베풀어 주었다.
고려의 국자감(國子監)은 고구려의 태학(太學)과 신라의 국학(國學)을 계승한 고등교육 기관이다. 충렬왕 때 원나라의 간섭으로 국학으로 개칭됐다. 충선왕 때 성균감(成均監)에 이어 성균관(成均館)으로 격상했다.
조선이 건국되자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고 성균관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졌다. 성균관은 생원시 진사시 등 소과에 합격한 생도들이 입학하여 대과를 준비했다. 성균관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여 왕조체제 유지에 기여했다.
문묘(文廟)는 문묘(文廟)란 글월 문(文)과 사당 묘(廟)라는 의미이며 공자의 위패를 모신 전각이다. 문선왕묘(文宣王廟)의 약칭으로 공자묘(孔子廟)라고도 부른다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에 설치했다.
 대성전(大成殿)에 공자(孔子)를 정위(正位)로 하여 안자(顔子) 자사(子思)는 동쪽에, 증자(曾子) 맹자(孟子)는 서쪽에 배치했고 공문10철과 송조6현을 동서로 배치했다. 동무와 서무에 신라 고려 조선 등 해동 명현 18위(位)를 동서로 배치했다.
대성전(大成殿)에 공자(孔子)를 정위(正位)로 하여 안자(顔子) 자사(子思)는 동쪽에, 증자(曾子) 맹자(孟子)는 서쪽에 배치했고 공문10철과 송조6현을 동서로 배치했다. 동무와 서무에 신라 고려 조선 등 해동 명현 18위(位)를 동서로 배치했다.
대성전(大成殿)을 정전(正殿)으로 하고 아래에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등을 두었다. 대성전의 남향으로 직통한 신로(神路) 옆에 어로(御路)가 어삼문(御三門)으로 통했다. 대성전은 보물 제141호로 지정됐다.
명륜당은 성균관 유생들이 글을 배우는 곳으로 '明倫堂(명륜당)' 편액은 명나라 주지번(朱之蕃)이 쓴 글이다. 명륜당 앞에는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고사에 따라 심은 은행나무가 솟아 있다 1,000원 화폐에 명륜당이 그려져 있다.
<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음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영조가 탕평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탕평비(蕩平碑)를 세웠다.
유교(儒敎)
유교(儒敎)는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孔子)가 체계화한 유학(儒學)을 말한다. 유학의 핵심 사상은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리는 것으로써 위정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공자는 주나라가 문왕-무왕-성왕-강왕으로 이어지는 전성기와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주공 단을 이상적인 질서로 숭상했다. 춘추시대의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유교는 신분 차별을 기본으로 하는 봉건 질서를 이상향으로 하여 지배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공자는 논어에 한번 군주는 영원한 군주인 것이고, 한번 신하는 영원한 신하인 것이다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를 남겼다.
유교는 전국시대에 제자백가의 하나인 유가(儒家)로 발전했다. 증자 자사 계통의 내성파는 맹자로 이어졌고 자하 자유 계통의 숭례파는 순자로 이어졌다. 유교는 농가 도가 음양가의 사상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의 철학을 흡수하여 발전했다.
전한의 무제 때 한왕조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로 국가 정통의 학문으로 채택됐다. 한나라와 당나라 때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소실된 유교 경전의 글자와 구절을 충실하게 해석하는 훈고학이 발전했다.
송나라 때 성리학이 성립되어 공자 증자 자사 맹자의 내성파의 계보가 중시되어 공자의 논어, 증자의 대학, 자사의 중용, 맹자의 맹자 등 4서가 성립됐다. 명나라 때 양명학, 청나라 때 고증학으로 성립됐다.
남송의 주자(朱子)는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 공자(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장재(張載)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자(朱子를 유학의 도통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