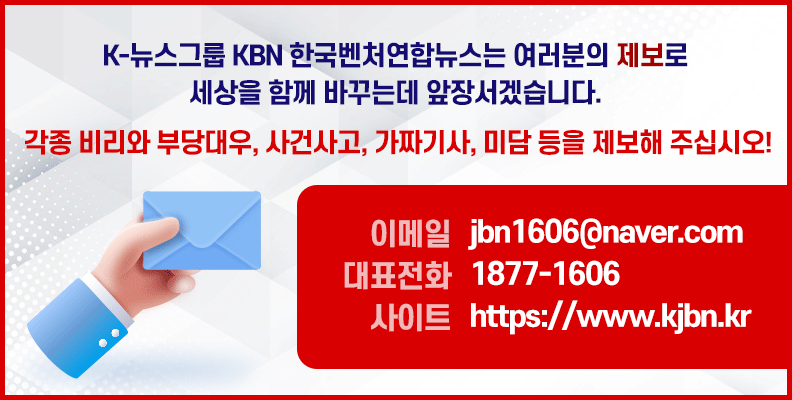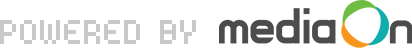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 신뢰 회복 ④>
양심의 판사를 보호하지 않는 사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법의 품격은 제도의 완결성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용기에 의해 완성된다. 아무리 정교한 인사 구조와 충실한 판결문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 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법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사법 신뢰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여기, ‘사람을 지키는 제도’에 있다.

모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원칙이 항상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소신에 따른 판단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퍼질 경우, 판사는 자연스럽게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사법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점차 활력을 잃는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자기 검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심적 판사가 소수일 때 발생한다. 다수는 무난함을 택하고, 소수만이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에서는 그 소수가 고립되기 쉽다. 사법 조직이 이러한 고립을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판결, 논란을 최소화한 판단뿐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조직의 평온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사법의 신뢰를 잠식한다.
양심의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영웅적 용기를 요구하는 문화가 아니다. 오히려 제도적 안전망이다. 소신 판결 이후 불이익 인사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 재판 내용과 인사 조치를 연결해 추정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문제 제기나 내부 비판이 징계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제도 역시 갖춰져야 한다. 이는 조직 기강을 해치는 조치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 독립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최소 조건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책임의 방향이다.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때 그 부담을 개인에게만 지우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는 용기를 요구하기보다, 용기가 필요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양심적 판단이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일상적 선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법의 모습이다.
앞선 두 회에서 살펴본 인사권의 분산과 판결의 설명 책임은 사법의 구조와 언어를 정비하는 작업이었다. 이번에 짚은 양심 판사 보호는 그 구조와 언어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마지막 조건이다. 인사 구조가 개선되고 판결의 논증이 강화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도는 형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사법 신뢰는 선언이나 구호로 회복되지 않는다. 인사권의 구조, 판결의 설명 방식,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연속 기획은 그 세 가지 조건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제 공은 제도와 사회로 넘어간다. 사법이 다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한이 아니라, 권한을 절제하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지혜다. 양심의 판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법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끝.
<칼럼 관련자료>
법은 왜 존재하는가?
https://www.kjbn.kr/mobile/article.html?no=7436
판사 인사권 분산이 사법 신회 회복의 출발점이다.
https://www.kjbn.kr/mobile/article.html?no=7441
설명 없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